-
2021년 한 해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 효능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해"라고 생각한다.
IT 교육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 회사에 3년 정도 있으면 또 다른 경험을 위해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21년도는 우형에서 3년이 되던 해였다.
이때, 우연히 아래 세미나를 듣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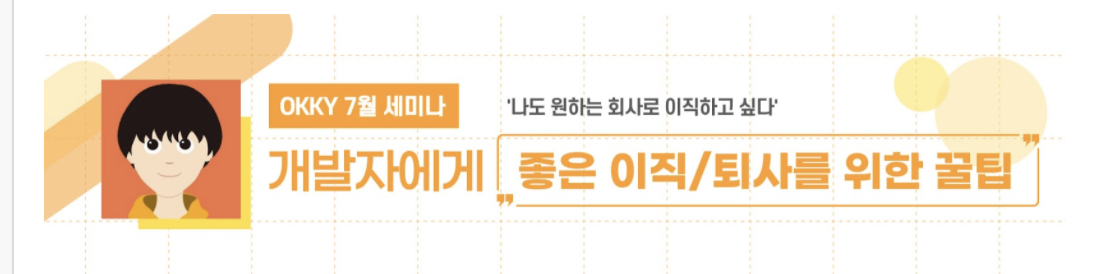
해당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굳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면접을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였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잘해 왔었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토스에서 연락을 주셨고,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됐다.
1차 면접은 기술면접이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TMI로 1차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분 중 한 분은 내가 3년 전 우형 면접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간 라인 채용설명회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었다. 그때 이 분이랑은 언젠가는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 사실은 입사하고 그분께 말씀드렸다.)
면접은 면접이라는 느낌보다 동료와 함께 치열하게 설계 고민을 하고 장애 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의 면접이 끝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과 함께 등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다.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1차 면접(기술 면접)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1차 면접을 합격하니, 2차 면접까지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2차 면접을 합격하니, 오퍼 레터까지만 받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 최종 합격을 했고 그때부터 이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당시 오퍼 레터를 받고도 한 달을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유는 우형에서도 여전히 해보고 싶은 일이 남아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과 헤어짐이 쉽지 않았다.
사실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형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 홍종완으로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토스에 힘들게 입사를 결정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나의 적응 속도였다.
좋은 개발자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감사하게도 당시에 도메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료들의 호흡에 맞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때,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던 것 같다.
자랑하는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나지만 자랑을 하자면 동료 피드백에서도 그리고 개발 리더 분의 피드백에서도 기술적 피드백은 없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점도 보였다.
첫 번째, 팀에서도 기대가 컸기에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너무 컸다.
일을 '조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당시에는 '개인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다.
조급하다 보니 멀리 보며 함께 가는 법을 고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 과제인지 몰랐다.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큰 고민조차 하지 않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만 급급했다.
당시에는 도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 동료들의 호흡을 따라가려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 말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이직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직을 안 했을 거냐고 반문한다면 그래도 나는 이직을 했을 것 같다고 말할 것 같다.
앞으로는 기술적인 고민 못지않게 멀리 보며 함께 가는 법과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도 조금씩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for. 동욱 님, 유성 님과의 멘토링 모임 회고용)